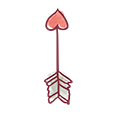2019. 3. 24. 04:43ㆍ유럽 여행 한 병/2018-2019 아이슬란드 한 잔
아이슬란드 7일차(1); 검은 모래와 성난 파도 그리고 주상절리의 조화, 레이니스피아라
*6일차 일정은 이 곳에*
2019/03/08 - [유럽 여행 한 병/2018-2019 아이슬란드 한 잔] - 아이슬란드 6일차(1);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얼음 동굴 투어, 요쿨살론)
2019/03/10 - [유럽 여행 한 병/2018-2019 아이슬란드 한 잔] - 아이슬란드 6일차(2);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다이아몬드 비치)
2019/03/11 - [유럽 여행 한 병/2018-2019 아이슬란드 한 잔] - 아이슬란드 6일차(3);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프얄살론/피얄살론)
아이슬란드에서의 지난 6일 동안,
날씨가 크게 나빴었던 적은 없었다.
겨울의 아이슬란드는 날씨가 큰 복병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날씨로 인해 발이 묶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7일차의 아침은,
엄청난 강풍이 나를 깨우고 있었다.
정말 바람이 창문을 깨부술 것만 같았다.
평소에 잠을 자면 소리에는 잘 안깨는 편인데,
그런 내가 바람소리에 깼을 정도니.
어마무시 했다.
이로 인해 7일차의 일정은 느긋하게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말이다
레이니르 게스트하우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레이니스피아라가 있어 우선 그곳에 가장 먼저 간 다음,
디르홀레이와 스코가포스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방향을 틀어 호그슬란드 코티지라는 숙소에 묵기로 하였다.
이는 바로 스카프타펠 빙하투어 때문.
이전에 예약을 잘못해서 못했던 빙하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다시 스카프타펠 부근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링로드 일정이 약 3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거의 4분의 3지점까지 온 상태였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시 스카프타펠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일 일정이 빡빡했다면 다시 돌아가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확실히 초반에 빡세게 다니니 후반부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세찬 바람이 깨우는 아침
세디 센 강풍이 아침을 알렸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뒤척이다가
결국 눈이 떠지게 되었다.
간만에 푹 잠이 든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도.
눈을 뜨니 대략 8시 쯤이었다.
우선 배가 고프니 아침을 먹으러 공용주방으로 향했다.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태어나서 이렇게 센 바람은 태풍 때 빼고는 못본 것 같은데
이 바람이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유롭게 10시 즈음에 출발하는 걸로 했다.
10시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슈퍼마켓 크로난.
레이니스피아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해변에 가기 전에 빠르게 들렸다.
비크에 있는 유일한 마트이기도 하니,
비크에 숙소가 있다면 이 곳엔 꼭 들려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음료수들하고
아침이나 점심에 제조할 핫도그의 빵을 샀다.
이런 소소한 먹거리가 아이슬란드에서는 하루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히 다뤄줘야한다.
이렇게 마트까지 들러서 식량을 구한 뒤,
본격적으로 해변을 향해 달렸다.
검정과 파랑이 오묘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레이니스피아라 해변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레이니스피아라(Reynisfjara)
피아라는 아이슬란드어로 해변이라는 뜻이므로,
한국말로 하자면 레이니스 해변이 되겠다.
레이니스피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은 모래 해변이다.
아이슬란드 자체가 화산암이 풍화된 지역이 많아
대부분의 해변이 검은 모래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가 바로 이 곳,
레이니스피아라이다.
1991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비열대 지역 해변 TOP 10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하였다.
그만큼 기대를 안고 가도 좋은 곳이다.
+++
주차장에서 도착해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괜히 겁이 났다.
강풍에 차 문을 열다가 꺾였다는 글을 카페에서 종종 봐서 그런지 조마조마하면서 열었다.
안그래도 강풍 주의보가 떴는데, 해변이다보니 바람이 더 심했던 것 같다.
그래도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차 밖으로 쏙 나왔다.
차에서 내려 쭉 걷다보면
멀리서부터 거대한 주상절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돌에 새겨진 결들이
이 곳을 더욱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
저 멀리에서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악마의 손가락이 보인다.
+++
레이니스피아라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에는 레이니스드랑가가,
오른쪽에는 디르홀레이가
해변의 매력을 더 빛나게 한다.
사진으로 제대로 담지 못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레이니스드랑가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
(비크 마을에서 바라볼 때 이 모양이 잘 보인다.)
레이니스드랑가는 레이니스피아라를 더욱 빛나게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바위지형이다.
이 레이니스드랑가로 인해 레이니스피아라 뿐만 아니라
비크 지역 전체가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이 바위에는 대략 두가지 설화가 전해져내려온다.
참 재미있는 건 두 설화 모두 햇빛에 닿으면 돌로 변해버리는 트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두 트롤들이 밤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고 해변으로 끌어오고자 하다가,
그 새 해가 떠버리는 바람에 배와 함께 돌로 변해버렸다는 설과,
두 트롤에 의해 아내가 살해당한 남편이
이들을 꾀임에 넘어가게하여 햇빛을 보게 해서 돌로 얼려버렸다는 설.
이 설화 때문에 그런지
손가락 모형의 바위는
트롤의 손가락, 혹은 악마의 손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전해져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자연에 또 다른 숨결을 불어 넣는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코끼리 모양의 바위, 디르홀레이가 장엄하게
우리를 향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꽃보다 청춘에서,
포스톤즈가 이탈리아 남성에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디르홀레이"
이 디르홀레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Door Hill island라는 의미이다.
문이 달려있는 언덕.
저 문을 통과하면,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것만 같다.
수세기의 시간동안 깎이고 또 깎여,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해낸 그런 곳이
바로 디르홀레이인 것이다.
얼핏 보기엔 저 사이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배 정도는 거뜬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93년, 어느 한 무모한 비행사는 저기를 통과했다고도 한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크기를 만들기까지의
그 세월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해변의 정면을 바라보면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다.
마음이 비워지고 있는 듯하다.
생명을 잉태한 파도는 내 텅 빈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잠시 눈을 위로 돌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를 반겨준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풍경.
자연스럽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것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풍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내 카메라 렌즈 속에
느닷없이 들어온 한 사람.
찰나의 순간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담았다.
거대한 파도와, 사람과, 모래.
원하지 않았던 풍경이
원했던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겨졌다가도
파도에 의해 부서져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에 남긴 우리의 추억은 아직 남아있다.
아무리 파도라 한들,
우리의 추억을 휩쓸어 갈 순 없다.
울퉁불퉁해서 더 멋있다.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그저 시간이 흘러간대로 있었기에
자연 본연의 가치가 더 빛나고 있다.
나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에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그 어떤 고통도,
모두 감내해야겠지.
지금 이 순간을 담는
이 사람을 담는다.
이 사람은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
이 곳에서 한 장에 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단순한 풍경일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생각일까.
수많은 틈새 사이로,
시간과 숨결과 손길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많은 화살.
그 화살들이 쏟아져내리는 것 같은 기분.
떨어질까봐,
아플까봐,
눈물이 날까봐,
그 아래로 가기 무서웠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화살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그 아래에 서야만 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손의 온기를
돌에 남겨본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곳에 왔을 땐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성숙한 내가
여기, 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유럽 여행 한 병 > 2018-2019 아이슬란드 한 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슬란드 6일차(3);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프얄살론/피얄살론) (0) | 2019.03.11 |
|---|---|
| 아이슬란드 6일차(2);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다이아몬드 비치) (2) | 2019.03.10 |
| 아이슬란드 6일차(1); 얼음의 나라에 입성하다 (얼음 동굴 투어, 요쿨살론) (0) | 2019.03.08 |
| 아이슬란드 5일차; 구불구불 동부 해안도로 드라이브 (feat.스톡스네스) (2) | 2019.03.06 |
| 아이슬란드 4일차(3); 하늘 위의 초록 커튼, 오로라를 만나다 (4) | 2019.03.04 |